무릉계곡 선경에 여름을 잊고 망상 명사십리에 시름을 묻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7-12 08:38본문


이곳에서 한 달쯤 푹 쉬었으면 싶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물소리를 듣다 기어이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발을 담근 채 바람이 나뭇잎을 쓸고 가는 소리를 듣는다. 비 내린 뒤 말끔하게 씻긴 하늘에서 내려온 햇살이 나뭇잎을 뚫고 부챗살처럼 퍼진다. 물살에 어룽대는 햇빛들. 발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물의 감촉이 좋다.
강원도 동해시 무릉계곡. 청옥산(1천4백4미터)과 두타산(1천3백53미터) 자락에 있다. 기묘한 바위들이 계곡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그 계곡에 폭포와 크고 작은 소들이 수없이 놓인 바위골짜기다. 그 모습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무릉’이라고 이름 붙었을까.
조선 선조 때 삼척부사를 지낸 김효원은 무릉계곡을 품은 두타산을 주유하고 ‘하늘 아래 산수로 이름 있는 나라는 해동조선과 같음이 없고, 해동에서도 산수로 이름난 고을은 영동 같음이 없다. 영동에서도 명승지는 금강산이 제일이고 그다음이 두타산이다’고 기록했다.
계곡 초입에 무릉반석이 있다. 3백~4백명은 넉넉히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 그 넓이가 1천5백여 평에 달한다. 옛 시인묵객들이 이 바위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다. 흥에 겨워 이름을 써놓은 이들도 있었다.
무릉반석 지나 쌍폭ㆍ용추폭포로 이어진 절경
조선시대 4대 명필로 유명한 양사언도 무릉계곡을 찾았다. ‘무릉선원 중대천석 두타동천’(武陵仙源 中臺泉石 頭陀洞天)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신선이 노닐던 이 세상의 별천지, 물과 돌이 부둥켜서 잉태한 오묘한 대자연에서, 잠시 세속의 탐욕을 버리니 수행의 길이 열리네’라는 뜻이다.
.jpg) |
| 작가 심상대는 <묵호를 아는가>에서 묵호 바다를 ‘한 잔의 소주와 같은 바다’라고 표현했다. ‘단숨에 들이켜고 싶은 고혹적인 빛깔’은 청량한 짠 내를 풍겼다. |
바위를 지나면 삼화사다. 신라 때 창건한 절이다. 본디 매표소 부근에 있었는데, 1977년 쌍용양회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신라시대 삼층석탑과 철조 노사나불좌상 등 보물이 있다.
삼화사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된다. 평탄한 길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지 않아 그다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숲길은 햇빛이 새어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다. 길 양옆으로 아름드리 소나무와 굴참나무가 몸을 배배 비틀며 서 있다. 굴참나무 껍질은 어른 손바닥만큼이나 두껍다.
약 20분을 더 오르면 학소대와 만난다. 거대한 암반이 벼루를 세워놓은 듯 떡 하니 버티고 서 있다. 이 암반 틈으로 흰 물줄기가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학소대란 물줄기가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학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학소대에서 잠시 멈췄던 걸음은 계속 숲길을 따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렁찬 물소리가 들린다. 철제 계단을 올라서면 만나는 절경. 무릉계곡의 자랑인 쌍폭이다. 두 개의 폭포가 한 소에서 만난다.
쌍폭 위쪽에 위치한 용추폭포에서 떨어진 물과 두타산 박달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곳이다. 소 주위에는 뽀얀 물보라가 안개처럼 일어난다. 왼쪽 폭포는 계단처럼 층층진 바위를 타고 물이 흘러내리고 오른쪽 폭포는 한번에 급전직하. 왜 무릉계곡인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무릉계곡의 또 다른 절경은 용추폭포다. 쌍폭에서 2~3분 거리다. 오목한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줄기가 소를 향해 주저없이 떨어져 내린다. 용추폭포가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삼척부사 유한전은 폭포 하단 절벽에 ‘용추’(龍湫)라는 글을 새겼다.
폭포 아래에는 ‘별유천지’(別有天地)라는 글귀도 또렷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 학자 이승휴가 은거하면서 ‘제왕운기’를 엮고, 영화감독 배용균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촬영지로 무릉계곡을 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소에서는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긴다.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용추폭포는 3단 폭포다. 밑에서는 맨 아래쪽 폭포밖에 보이지 않지만 철제 계단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3단 폭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
| 추암해변에 솟은 기기묘묘한 바위. 바위에 부딪히는 추암의 파도 소리는 한국의 1백 명소리로 선정 됐다. |
망상해수욕장은 동해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다. 알맞게 자란 고만고만한 송림을 두른 해안선은 눈썹처럼 휘어져 있다. 모래밭은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곱다. 해변의 크고 넓으며, 길이가 5킬로미터에 달해 ‘명사십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을 햇살이 녹아내리는 맑은 바다는 온통 쪽빛이다. 파도소리를 들으며 한가롭게 해변을 거니는 연인들이 눈에 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와 은수가 파도소리를 녹음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망상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동해바다를 옆으로 끼고 어달리까지 이어진다. 이 중 4킬로미터에 이르는 어달리 해안도로는 짧지만 해안 드라이브의 낭만을 맛볼 수 있는 구간. 길은 바다를 따라 이리저리 휘어지고 차창 옆으로는 파도가 밀려온다. 손바닥만 한 포구에서부터 횟집, 까막바위 등 볼거리가 많다.
해안선의 아기자기한 멋에 영화감독들 러브콜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묵호항이 나온다. 묵호항은 동해에서 항구의 정취를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묵호항은 아침에 찾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밤새 오징어잡이를 마친 배들이 뱃고동을 울리며 돌아오는 새벽항구는 싱싱한 생명력이 살아있다. 경매에 열을 올리는 경매사들과 동해시 횟집에서 나온 상인들로 북적인다.
 |
| 묵호 등대오름길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졌다. |
묵호 어시장 뒤편 산등성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붉고 푸른 지붕을 얹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 묵호항에서 이 마을까지 ‘등대오름길’이라는 예쁜 길이 이어진다.
길 끝에 묵호등대가 서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옛 묵호항의 정취와 마을의 풍경을 추억하는 벽화들을 만날 수 있다. 출항하는 오징어배, 해풍에 말라가는 오징어, 대폿집과 이발소, 구멍가게 등의 벽화들이 마음 한쪽을 짠하게 만든다.
묵호등대를 찾는다면 저물 무렵이 좋을 듯. 등대에 불이 들어올 때면 수평선 가득 오징어잡이배의 불빛이 돋는다. 망망한 바다에 두둥실 떠 있는 어화는 꿈결처럼 아름답다. 묵호등대는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촬영지기도 하다.
 |
| 묵호는 오징어 집산지로도 유명하다. |
길은 계속 흘러 추암해수욕장에 닿는다. 추암해수욕장은 TV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오는 일출 장면을 찍은 곳이다.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수십만 명의 해맞이 관광객이 추암해수욕장을 찾는다. 해변 왼편에는 갖가지 형상의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데 그중 절묘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다. 이 바위가 바로 ‘촛대바위’다.
바위 틈으로 불쑥 솟아오르는 일출은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다. 조선 세조 때 한명회가 강원도 제찰사로 있으면서 그 경관에 취한 나머지 미인의 걸음걸이에 비유하여 ‘능파대’라고 부르기도 했던 곳. 바위에 부딪히는 추암의 파도 소리도 아름다워 한국의 1백 명소리로 선정돼 있다.
글과 사진·최갑수 (시인·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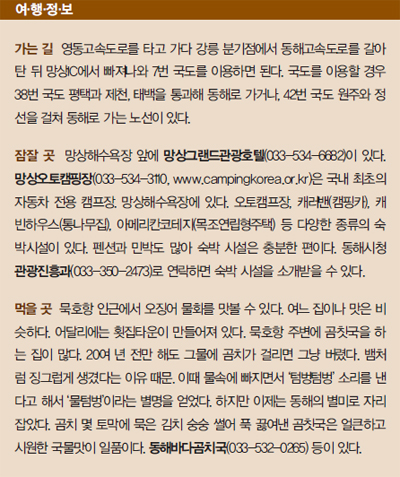 |


